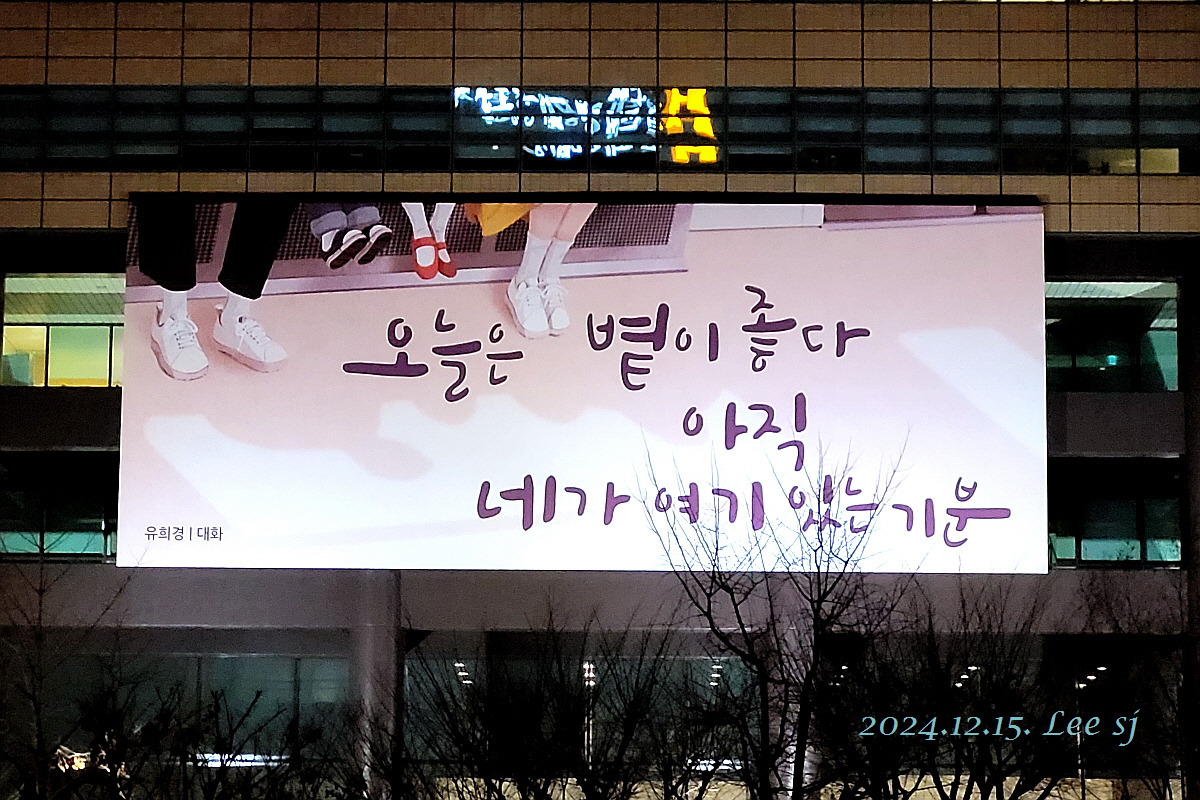4월의 시 이해인 꽃무더기 세상을 삽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은 오만가지 색색의 고운 꽃들이 자기가 제일인 양 활짝들 피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새삼스레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고운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이며 꽃들 가득한 사월의 길목에 살고 있음이 감동입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이 봄을 느끼며 가슴 터지도록 이 봄을 즐기며 두발 부르트도록 꽃길 걸어볼랍니다 내일도 내 것이 아닌데 내년 봄은 너무 멀지요 오늘 이 봄을 사랑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4월이 문을 엽니다